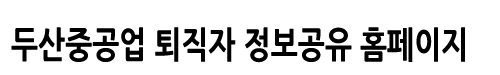병의 크기를 바꿔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003-10-02 00:29본문
60년대말 코카콜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을 때였다. 초기에 팔리는 게 영 시원찮으면서 급기야 본사에서 부사장이 둘러보러 왔다. 한국지사는 야단법석이었겠지만, 부사장은 큰 식료품 가게는 물론 동네 구멍가게와 식당 등을 이곳 저곳 둘러보고는 별 말없이 돌아갔다. 곧 바로 그 부사장은 매우 짤막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병의 크기를 키우시오"
이에 따라 병을 크게 만들어 내놓았더니 과연 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므로 진위(眞僞)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당시만 해도 콜라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이 고작으로 한국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음료수였다. 따라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내용물을 약간 바꾸거나 값을 내리는 것이다. 아니면 경품을 하거나 다른 제품에 끼어파는 전략 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부사장은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을 둘러 보면서 한국인이 '입맛'도 까다롭지만 '보는 맛', '쥐는 맛' 또한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허풍(虛風)을 단번에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물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는 한국인의 허풍을. 요즘에도 어쩌다 눈에 띄지만 소형(小型) 코카콜라 병은 사실 앙증맞을 정도로 작다. 맛은 차치하고서 "글쎄, 병이 이렇게 작아서야 어디 한 모금이나 되나", "젊잖은 양반 체면에 이렇게 작은 병을 들고 마실 수야 없지"하는 말들을 했을 것이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들어낸 발명품은 '전기식 투표기(electric vote recorder)'였다. 자신의 최초 특허품이었지만 100여년이 지난 뒤에야 채택될 정도로 너무 앞서가는 발명이었다. 편리하기는 해도 구태여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살 기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맨 처음 투표가 자주 있는 미국 의회에다 팔려고 했더니 거의 모든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투표하러 나갈 때마다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걸어 나가는 맛과 멋을 잃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실망한 에디슨이 "다시는 돈 안되는 발명은 않겠다"고 다짐한 후 내놓은 두번째 작품이 '주식시세 표시기(stock ticker)'. 3000달러 정도라도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남북전쟁 직후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무려 4만달러에 팔렸다. 4만달러라는 말을 듣고 에디슨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 했을 정도로 엄청난 거금이었다. 요즘 돈으로 100만달러정도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에디슨은 실험실을 차려 이후 1000개가 넘는 발명을 계속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작년에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는 광고가 두어건 있었다. 월드컵 당시 어느 회사의 광고모델로 가수 장나라가 나왔다. '한 골 부탁한다'고 언급한 선수마다 실제로 골을 넣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문제
는 그 회사가 뜬 것이 아니라 모델이 떳다는 점이다. 심지어 회사 광고가 아니라 공익광고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장나라가 월드컵 기간중 실시된 지방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대사로 투표참가를 권유하는 광고모델로 나왔었기 때문이었다. 장나라를 통한 광고효과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헛돈을 많이 쓴 셈이다.
작년초 어느 신용카드 회사의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막상 신용카드사 이름은 생각이 안나도 모델이었던 김정은은 스타가 됐다. 미국에서도 최근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컴퓨터회사 애플의 '스위치(Switch·PC를 맥킨토시로 바꿔라)'라는 TV 광고에 등장한 엘렌 파이스(Ellen Feiss)라는 10대 소녀의 펜클럽 홈페이지가 이메일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정작 광고주인 애플이 바라는 '아이맥(iMac)'의 판매는 지지부진할 뿐이다.
어떤 제품이건 광고건 눈높이가 맞아야 한다. 시대를 너무 앞서는 광고는 발명을 위한 발명처럼 광고를 위한 광고로 끝나기 십상이다. 또 제품보다 모델이 앞서는 경우도 주객(主客)이 바뀌면서 광고효과를 최대화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돈 안되는 발명과 마찬가지로 돈 안되는 광고는 돈만 들어갈 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광고다. 불특정다수(nonpersonal)를 대상으로 '눈높이 맞추기' 또는 '정확한 포지셔닝(positioning)'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기호·지역·성별·연령·계절·모델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병의 크기가 판매량을 좌우하듯 모델과 문구의 작은 차이에 따라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광고효과이기 때문이다.
/최성환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sungchoi@chosun.com
"병의 크기를 키우시오"
이에 따라 병을 크게 만들어 내놓았더니 과연 잘 팔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므로 진위(眞僞)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당시만 해도 콜라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이 고작으로 한국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음료수였다. 따라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내용물을 약간 바꾸거나 값을 내리는 것이다. 아니면 경품을 하거나 다른 제품에 끼어파는 전략 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부사장은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을 둘러 보면서 한국인이 '입맛'도 까다롭지만 '보는 맛', '쥐는 맛' 또한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허풍(虛風)을 단번에 간파했다고 할 수 있다. '물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는 한국인의 허풍을. 요즘에도 어쩌다 눈에 띄지만 소형(小型) 코카콜라 병은 사실 앙증맞을 정도로 작다. 맛은 차치하고서 "글쎄, 병이 이렇게 작아서야 어디 한 모금이나 되나", "젊잖은 양반 체면에 이렇게 작은 병을 들고 마실 수야 없지"하는 말들을 했을 것이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맨 처음 만들어낸 발명품은 '전기식 투표기(electric vote recorder)'였다. 자신의 최초 특허품이었지만 100여년이 지난 뒤에야 채택될 정도로 너무 앞서가는 발명이었다. 편리하기는 해도 구태여 돈을 들여 가면서까지 살 기계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맨 처음 투표가 자주 있는 미국 의회에다 팔려고 했더니 거의 모든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투표하러 나갈 때마다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걸어 나가는 맛과 멋을 잃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실망한 에디슨이 "다시는 돈 안되는 발명은 않겠다"고 다짐한 후 내놓은 두번째 작품이 '주식시세 표시기(stock ticker)'. 3000달러 정도라도 팔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남북전쟁 직후 주식투자 붐이 일면서 무려 4만달러에 팔렸다. 4만달러라는 말을 듣고 에디슨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 했을 정도로 엄청난 거금이었다. 요즘 돈으로 100만달러정도에 해당하는 그 돈으로 에디슨은 실험실을 차려 이후 1000개가 넘는 발명을 계속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작년에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는 광고가 두어건 있었다. 월드컵 당시 어느 회사의 광고모델로 가수 장나라가 나왔다. '한 골 부탁한다'고 언급한 선수마다 실제로 골을 넣어 화제가 됐다. 그런데 문제
는 그 회사가 뜬 것이 아니라 모델이 떳다는 점이다. 심지어 회사 광고가 아니라 공익광고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장나라가 월드컵 기간중 실시된 지방선거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대사로 투표참가를 권유하는 광고모델로 나왔었기 때문이었다. 장나라를 통한 광고효과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헛돈을 많이 쓴 셈이다.
작년초 어느 신용카드 회사의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막상 신용카드사 이름은 생각이 안나도 모델이었던 김정은은 스타가 됐다. 미국에서도 최근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 컴퓨터회사 애플의 '스위치(Switch·PC를 맥킨토시로 바꿔라)'라는 TV 광고에 등장한 엘렌 파이스(Ellen Feiss)라는 10대 소녀의 펜클럽 홈페이지가 이메일로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정작 광고주인 애플이 바라는 '아이맥(iMac)'의 판매는 지지부진할 뿐이다.
어떤 제품이건 광고건 눈높이가 맞아야 한다. 시대를 너무 앞서는 광고는 발명을 위한 발명처럼 광고를 위한 광고로 끝나기 십상이다. 또 제품보다 모델이 앞서는 경우도 주객(主客)이 바뀌면서 광고효과를 최대화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돈 안되는 발명과 마찬가지로 돈 안되는 광고는 돈만 들어갈 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광고다. 불특정다수(nonpersonal)를 대상으로 '눈높이 맞추기' 또는 '정확한 포지셔닝(positioning)'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기호·지역·성별·연령·계절·모델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 병의 크기가 판매량을 좌우하듯 모델과 문구의 작은 차이에 따라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광고효과이기 때문이다.
/최성환 조선일보 경제전문기자 sungchoi@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